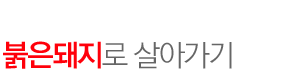너무 늦은....선거에 대한 회한, 그리고 책 '눈뜬 자들의 도시'
book 2008. 4. 15. 00:14 |'정치권력은 일상에 얼마만큼 작동하는가'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서로의 입장과 삶의 경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요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몸서리 칠만한 일이긴 하지.
허나 가끔은 술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때가 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혹시 내가 그들의 칼날을 피하더라도, 그대가 그 칼을 대신 맞을 수 있음에 대해,
아직 행동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울 수 있으며,
그 뜨거움이 변화시킬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한것보다 얼마나 더 새로울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하고,
현시점에서 우리의 지향과 대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가보고 싶지만,
늘 우리의 대화는 엇나가기 일수다.
마치 서로 작정한 것처럼...
'눈뜬 자들의 도시' 에서 시민들은 '눈먼 자들의 도시' 로부터 벗어난 4년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백지투표행렬에 동참한다.
누가, 왜, 어떻게 그런 집단적인 행동을 진행했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소설의 대부분인듯 달려가지만 끝내는 한권의 소설 내내
각각의 정치세력은 줄곧 조롱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대로, 멋지고, 우아하게 조롱해봤으면...
서로의 입장과 삶의 경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요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몸서리 칠만한 일이긴 하지.
허나 가끔은 술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때가 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혹시 내가 그들의 칼날을 피하더라도, 그대가 그 칼을 대신 맞을 수 있음에 대해,
아직 행동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울 수 있으며,
그 뜨거움이 변화시킬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한것보다 얼마나 더 새로울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하고,
현시점에서 우리의 지향과 대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가보고 싶지만,
늘 우리의 대화는 엇나가기 일수다.
마치 서로 작정한 것처럼...
'눈뜬 자들의 도시' 에서 시민들은 '눈먼 자들의 도시' 로부터 벗어난 4년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백지투표행렬에 동참한다.
누가, 왜, 어떻게 그런 집단적인 행동을 진행했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소설의 대부분인듯 달려가지만 끝내는 한권의 소설 내내
각각의 정치세력은 줄곧 조롱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대로, 멋지고, 우아하게 조롱해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