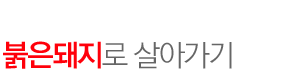영화 '타인의 삶'
film 2007. 4. 23. 03:23 |
도청중인 비즐리 (울리쉬 뮤흐)
사전 정보는 거의 없었다.다음탑에 1-2주 계속 평점 1위인것이 오히려 못마땅하기도 했다.
오랜만의 독일영화라는 신선함에 대한 기대 하나로 예매를 하는데,
벌써 많이들 내렸거나, 하루에 1-2회만 상영을 하다보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
거의 7-8년만에 명보극장을 찾았다. 언젠가 명보극장이 개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근래에 가본 극장중 가장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는 극장이었던 것 같음.
의자에서 전해지는 지하철 3호선 지나는 진동이며,
유니폼 상의를 풀어헤치고, 런닝셔츠를 드러내놓고, 바닥을 빗질하고 다니는 아저씨,
한적한 매점 등등 극장이 주는 포스가 10여년 전을 그대로 느끼게 하더군.
영화는 제대로 건축된 푸랑크푸르트 다리같은 느낌이었다.
튼튼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감정은 최대한 자제되어있는듯하지만,
사람들을 푸근하게 지켜봐주고 있는 듯한 기분...
엿보기는 이미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있다.
또 의외로 우린 엿보여주기에도 또한 능숙하다.
그것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뿐이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까지꺼 그냥 닫으면 끝일 수도 있으니까.
허나 영화는 권력에 의한, 권력의 왜곡된 욕망에 의한 엿보기의 섬뜩함을 이야기한다.
엿보기를 당하는 작가 그라이만은 그나마 동독에 남은 몇안되는 체제를 옹호하는,
그 체제 속에서의 이상을 지향하는 작가임에도 도청과 감시 속에서 사적공간을 점령당한다.
그렇게 이상적인 체제를 향한 개인의 감시마저도 공감 받기 어려운 것인데,
게다가 그 감시를 지시한 장관은 사실은 그라이만의 연인, 크리스탈을 소유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다.
국가와 체제에 대한 이상화, 그 이상화의 탈을 쓴 욕망을 감독은 너무나 담담하게 그려낸다.
장관이 크리스탈을 겁탈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본 영화속 강간장면 중 가장 낯뜨거웠다고 해야하나...정말 욱하니 먹은게 올라오는 것 같은, '돌이킬수 없는' 에서 모니카벨루치의 지하도 장면 다음으로 가장 역했었다.
그러나 그 섬뜩함 속에서도 인간은 또 다른 방향의 진화를 경험하기도하지.
영화 속에서 엿보기의 주체를 맡은 비밀경찰간부이자, 비밀경찰 도감청강의 교수인 비즐리는 서서히 엿보기 대상에 의해 오히려 해체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이 읽는 브레히트의 시에, 그들이 나누는 사랑에 깊은 감정의 울림을 경험하고,
점점 엿보기가 아닌 현실 생활에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
좁은 어깨에 군더더기 없는 복장으로 팔도 제대로 흔들지 않는 정적인 표정과 자세가 그의 고독을 절절하게 만든다. 비즐리가 도청을 시작할때부터 작가와 연인이 관련된 장면에서는 관객인 나는 비즐리가 된다. 그들이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장면들을 비즐리가 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내가 곧 비즐리가 된듯한 불편함을, 또 동일한 감정선을 붙잡고 가는 동지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비즐리가 첨으로 몸을 파는 여인을 불렀다가 돌아가려는 그녀를 붙잡고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할때, 나도 역시 낯이 뜨겁기도 하고, 또한 그가 한없이 비루하고 짠해보이기도 하더군.
독일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인지,
내가 볼 정도이면 이미 많이 필터링 된 영화이기 때문인지,
한번도 실망해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바그다드카페, 베를린 천사의 시, 노킹온헤븐스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