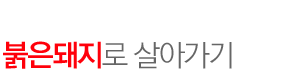다시 smoke를 보다 - 내 사랑하는 영화에 대하여..
film 2008. 4. 24. 01:24 |
대략 19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고,
가끔 사진을 찍는다.
말못할 사연 한두개쯤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뉴욕 어느 거리, 평범한 사람들의 곡절 깊은 이야기들,
난 그 이야기를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 8시 매일 자기 담배가게를 사진으로 찍고,
친구는 아내를 잃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도둑의 돈을 훔친 아이는 도둑에게 쫓기면서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고,
18년동안 헤어졌던 여인은 남자에게 딸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야 알리면서 돈을 뜯는다.
매일 아침 한장씩, 4천장을 찍어대던 그 Canon AE-1 카메라는 알고보니 훔친 것이었다.
작은 일상이 모여 역사를 만든다.
삶은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비정형적으로 점멸하는 것일진데,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세상의 이런 저런 숱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내게 있고,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여하는 좋은 취미꺼리가 있을 것이며,
그런 저런 꺼리들로 어느 누구와도 맥주한잔을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착하면서도 쿨한 좋은 아저씨가 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장이나, 대통령이되는 것만큼뿌듯하고 기분좋은 일일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 별로 자신은 없는 것이다.